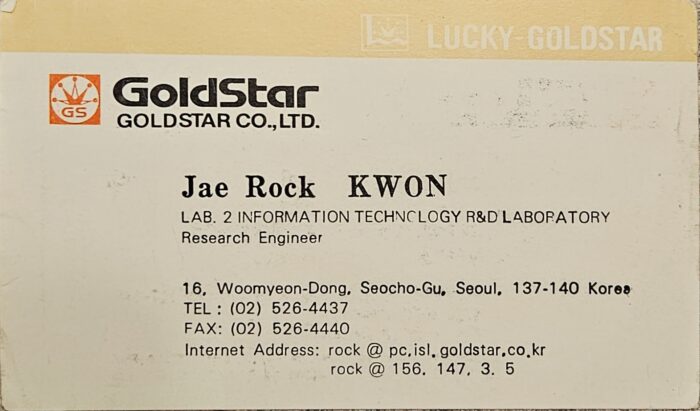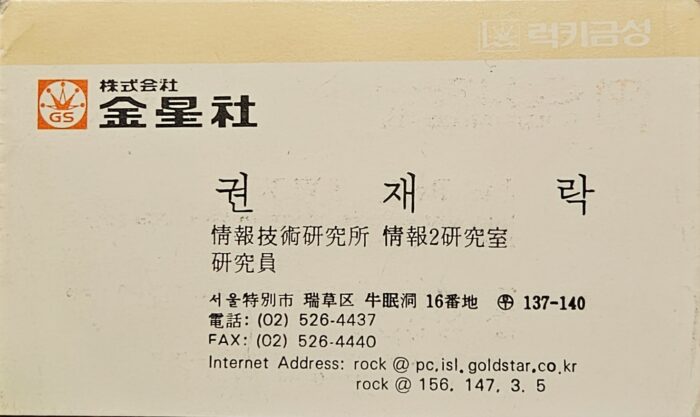불법 비상 계엄으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포함하여 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우리나라 최강의 부대를 동원했다가, 그 사령관들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군장성, 영관급 장교들이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
인조반정 즈음에 지금의 북만주 지역에는 후금이 등장해서 그 기세를 키워가던 중이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인조반정의 공신 중 하나였던 이괄은 그 북방의 경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반정공신들 간의 알력으로 이괄의 아들이 포함된 역모 의혹 사건이 발생하지만, 조사 후 무고로 밝혀진다. 하지만 이괄을 잡아와 아들의 모반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괄을 서울로 압송하려 한다. 이괄은 아들이 모반죄라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킨다. 1만여 병력을 이끌고 한양을 점령하는 등 초기에는 꽤 기세를 올렸지만, 곧 전열을 정비한 관군에게 대패하여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북방 수비의 주력군이 무너지고, 반란군 일부가 후금으로 도망하여, 후에 정묘호란 등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말기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보니, 조선의 군사력을 대단치 않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조선 초기나 중기의 조선군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군대가 아니었다. 후금으로서도 조선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두차례 호란에서도 소수병력의 기습으로 한양으로 곧바로 진격하여 왕을 잡고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 했다.
만일 이괄의 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북방 수비를 위한 주력군이 유지되었다면, 후금의 입장에서도 쉽게 조선을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