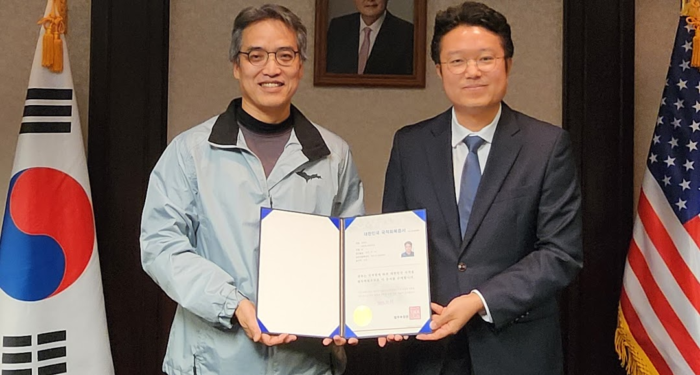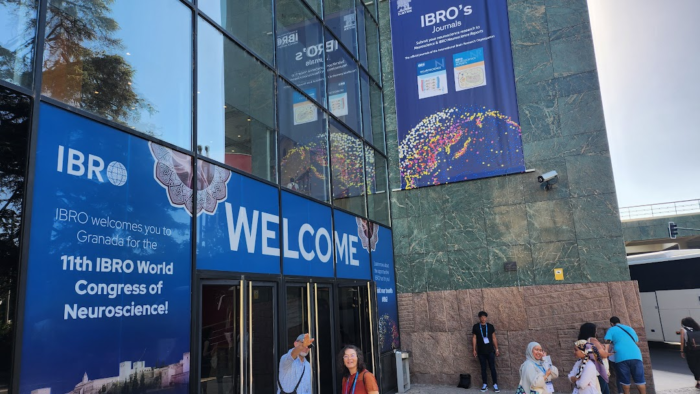타국생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도 좁고, 접하는 매체도 다양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기회도 자주 없다보니 나이들면서는 나만의 생각에 더 깊이 빠지게 되면서 생기게 될 아집이 걱정되었다.
우연한 다른 기회를 통해 알게된 분들과 조촐하게 독서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 2019년이다. 매달 하기로 했지만, 책이 두꺼워 여러 달로 나눠하게 된 경우도 있고, 다른 이유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 몇 달에 한 번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와 어느새 만 6년이 되었다.
책의 주제는 어떤 것이든 순차가 돌아온 사람이 정하는 것으로 해서, 특정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함께 읽게 되었다. 빠진 책들이 더러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읽은 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보았다. 다른 분들이 추천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을 책들이 많다.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신 모임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 책들을 읽고 더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더 넓은 사람이 되었다면 모두 이 책들 덕분이다.
1️⃣ 과학 · 기술 · 자연철학
- Energy and Civilization: A History — Vaclav Smil
- E = mc² — 데이비드 보더니스
- QED: The Strange Theory of Light and Matter — Richard Feynman
- Quantum Chance: Nonlocality, Teleportation and Other Quantum Marvels — Nicolas Gisin
- The Selfish Gene — Richard Dawkins
- The Vital Question — Nick Lane
- Factfulness — Hans Rosling, Ola Rosling, Anna Rosling Rönnlund
- Pandemic: Tracking Contagions, from Cholera to Coronaviruses and Beyond — Sonia Shah
2️⃣ 철학 · 과학철학 · 인지
- How to Create a Mind — Ray Kurzweil
- Free Will — Sam Harris
- What Money Can’t Buy — Michael J. Sandel
- 과학, 철학을 만나다 — 장하석
-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니콜라스 카
3️⃣ 역사 · 문명 · 세계사
- Sapiens — Yuval Noah Harari
-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 Howard Zinn
- Korean Sketches — James S. Gale
- Japan and the Shackles of the Past — Taggart Murphy
-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라시드 할리디
4️⃣ 정치 · 국제관계 · 권력
- The Narrow Corridor: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 — Daron Acemoglu & James A. Robinson
- How to Lose a Country — Ece Temelkuran
-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 Tim Alberta
- China’s Gilded Age: The Paradox of Economic Boom and Vast Corruption — Yuen Yuen Ang
- 제국과 의로운 민족 — Odd Arne Westad
-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 김동기
5️⃣ 경제 · 사회 · 불평등
- Scarcity — Sendhil Mullainathan & Eldar Shafir
- The Common Good — Robert Reich
- 불평등의 세대 — 이철승
- 한국의 능력주의 — 박권일
- 쓸모있는 경제학 — 이완배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오찬호
- White Fragility — Robin DiAngelo
6️⃣ 인문 에세이 · 비평 · 지식 교양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 채사장
- 담론 — 신영복
- 국경일기 — 정문태
- 열흘짜리 배낭여행 — 김유경
7️⃣ 문학 (소설 · 서사)
- Hunger — Knut Hamsun
- 페스트 — 알베르 카뮈
- 소년이 온다 — 한강
- 오베라는 남자 — 프레드릭 배크만
8️⃣ 법 · 정의 · 사회비판
- 디케의 눈물 — 조국
- 법고전 산책 — 조국
- 죄수와 검사: 죄수들이 쓴 공소장 — 심인보 외